지프·인피니티·BMW·벤츠 등, 천연가죽 축소
친환경 레더렛·재활용 원단·울 등 대체 소재 도입
가죽 없는 럭셔리, 진짜 고급인가 타협인가

한때 고급차의 상징이던 천연가죽 인테리어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6년형 지프 체로키다. 차체 크기와 편의 사양은 대폭 커졌지만, 최상위 오버랜드 트림조차 진짜 가죽 대신 카프리 레더렛(합성가죽)만 제공한다. 4만4천 달러(약 6천만 원)를 지불하고도 인조가죽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과거라면 당연히 포함 됐을 사양이 이제는 친환경이라는 명목 아래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프리미엄 기준의 변화

지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피니티 QX60(2026년형)은 대부분 트림에서 65% 재활용 소재로 만든 ‘테일러 핏’ 원단을 사용한다. 오직 최상위 오토그래프 트림에서만 세미 아닐린 가죽을 제공한다. 랜드로버는 레인지로버에 ‘울트라 패브릭스’를 적용하며, 폴스타는 동물복지 인증 울이나 친환경 합성소재인 마이크로텍, 위브텍 등을 내세운다. ‘가죽=럭셔리’라는 공식을 흔들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흐름이다.
소비자 기대와 현실의 간극

문제는 소비자들의 체감이다. 여전히 일부 구매자들은 가죽이 빠진 모델을 ‘급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심지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처럼 여전히 가죽을 제공하되 별도 유료 옵션으로 전환하는 브랜드도 있다.
예컨대 2026년형 메르세데스 GLE 350은 기본가가 6만2천 달러(약 8,600만 원)가 넘지만 시트는 MB-Tex(합성가죽)이며, 천연가죽을 원하면 약 225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BMW X5(6만7천 달러, 약 9,300만 원) 역시 센사핀 합성가죽이 기본이고, 가죽은 약 270만 원 짜리 옵션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이라는 이유가 고급 감을 희생하거나 비용 전가로 이어진다고 느낄 수 있다.
럭셔리의 정의, 바뀌는 중

결국 핵심 질문은 “럭셔리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데 있다. 과거에는 천연가죽과 원목, 금속 소재 같은 전통적 자재가 고급스러움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업계는 친환경·지속가능성·첨단 기술을 새로운 럭셔리의 척도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합성가죽이나 재활용 원단은 관리가 편하고, 내구성도 뛰어나며, 환경 부담도 적다. 더 나아가 일부 소재는 천연가죽보다 통기성과 촉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 심리 속에는 여전히 “가죽이 있어야 고급”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브랜드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가죽을 빼버린다면, 오히려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 반대로 BMW·벤츠처럼 선택권을 주되 추가 비용을 받는 방식은 현실적이지만, “고급차를 사면서 가죽조차 기본이 아니다”라는 불만을 키울 수 있다.
결국 업계는 새로운 소재를 럭셔리의 ‘대체재’가 아닌 ‘진화된 기준’으로 설득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죽 없는 고급차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단순한 친환경 메시지를 넘어, 실제 체감 품질과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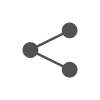
댓글0